강
삼백 예순 다섯 개의 강을
두 다리 쉴 새 없이 옮겨 놓던 어느 날
턱진 여울목을 만났다.
여남은 개의 강을 남겨두고
가쁜 숨 풀어내던 다음날이었다.
머리에는
아직 나지 못한 일들이 틈새를 엿보고,
발꿈치를 노리던 일들은
손 휘저으며 잡아주기를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다.
결국
안개 속 같이 뿌연 날들을
내과로, 안과로,
그리곤 안경점을 기웃거리다
노을 비치는 창 두개를
얼굴에 걸쳐두었다.
어떤 이는 뇌를 염려해
엠알아이를 찍자고 보채고
어떤 이는
만성피로이니 영양주사를 맞자고 재촉했다.
저문 강의 햇발이 눈부시다.
그렇게 스며든 따듯함을
가슴으로 품고 삭혀
세상을 향해 쏟아내고 싶다.
여남은 날들을 더듬으며
빚어낸 반짝임이다.
또 다른 삼백여개의 강중에
여남은 개의 강을 건너며
길어 올린 눈부심이다.
강은
가쁜 숨 몰아쉬며 건널 수 없다는.
눈을 들어
아직 뿌연 강 너머를 더듬는다.
2012, 1, 14
커텐제작, 납품, 시험 등을 치루고
긴장이 풀린 탓인지 어지러운가 싶더니
급기야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
원인이 됐음직한 일이 여럿인지라
해결 방법을 권하는 의견 또한 분분하다.
분분한 의견 속에
따듯한 마음을 나누어주는 이들이 오롯하다.
가게를 봐 주겠다는 이
링겔을 맞춰주겠다는 이 등.
3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어른거리는 눈으로
키보드를 누르고 있다.
그 눈으로 책이나 신문을 보기도 한다.
누군가에게 들키면 또 혼 줄이 날 테지만
언젠가는
내 신체의 일부가 될 다초점 안경을
썼다 벗었다
요지경을 떨고 있다.
亂時인 時局을 견디다 못해
亂視가 되었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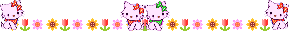 음악 안들리면 클릭 하세요. |
'—…³οο ı ĿØЦЁ УØЧ > ´˝˚³οο ı Łονё feel'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행진 (0) | 2012.08.25 |
|---|---|
| 인생 (0) | 2012.02.11 |
| 네 앞에서 (0) | 2011.09.30 |
| 국화 앞에서 (0) | 2011.09.25 |
| 존재 (0) | 2011.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