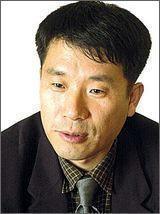[조용헌 살롱] 돈에 대한 철학
인간이 살아 생전에 확실한 사생관(死生觀)을 정립하기 어렵지만, 재물관(財物觀)을 정립하기도 참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재물관을 제대로 정립한 집안을 꼽는다면 역시 경주 최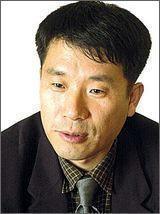 부잣집이다.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흉년에 논 사지 않는다'는 최부잣집의 재물관은 세계에 내놓을 만한 철학이다.
부잣집이다.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흉년에 논 사지 않는다'는 최부잣집의 재물관은 세계에 내놓을 만한 철학이다.
최부잣집이 이런 철학을 갖게 된 배경에는 어떤 스님의 영향이 있었다고 한다. '재물은 퇴비와 같아서 한군데 쌓아놓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여러 군데로 뿌리면 곡식을 살리는 거름이 된다'는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최씨 집안에서는 만석 이상이 되면 사회에 환원하는 철학을 실천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박연차 사건을 보니 일단 재물을 여러 군데로 뿌리기는 잘 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진동한다. 뿌릴 때도 잘 뿌려야 하고, 받는 사람도 상대가 뿌린다고 덥석덥석 받을 일이 아니라는 교훈을 얻었다.
원불교를 창립한 소태산(少太山) 박중빈은 제자들에게 돈 문제를 조심하라고 가르쳤다. '심교(心交) 간에 금전을 주고받지 말라'는 것이었다. 서로 친한 관계일수록 돈거래를 하기 쉽고, 이 돈거래를 하다가 자 서로 상처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지 말고 자기 형편에 따라 되는대로 그냥 '보시'하라고 가르쳤다.
서로 상처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지 말고 자기 형편에 따라 되는대로 그냥 '보시'하라고 가르쳤다.
몇 년 전 요가의 고수를 만나러 인도 북부지방을 방문했던 적이 있다. 요가의 대가들은 날씨가 선선하고 고지대인 북인도 쪽에 많이 산다. 여기서는 히말라야도 가깝기 때문이다. 50대 초반의 '푸르샴'이라는 이름을 가진 요기를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돈 문제였다. 나는 "도를 닦으려면 돈을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될 수 있으면 돈거래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내용의 말을 건넸다. 그러자 푸르샴은 "아니다. 수행자는 돈을 만져 보아야 한다. 돈도 서로 거래해 보아야 한다"는 예상외의 이야기를 하였다. 돈을 거래해 보아서 마음에 분노심이 나거나, 돈을 못 받게 되어 억울한 마음이 들면 아직 공부가 덜되었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담담하면 공부가 되었다는 주장이었다. 돈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도를 통한 군자이다.
입력 : 2009.03.30 03:12 goat13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