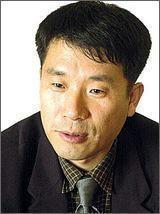|
소에 대한 명상 만해 한용운은 말년에 서울 성북동에다 북향집으로 심우장(尋牛莊)을 짓고 살았다. 암울했던 일제시대에 그는 '님의 침묵'을 노래했다. 그러다가 말년에는 그 '님'을 포기하고 대신에 '소'를 찾기로 한 것인가? 동양의 정신문화에서 '소'는 종교적 의미를 띠고 있다. 소는 인간의 근원적인 본성을 뜻한다. 이를 '맹목적인 의지'라고도 표현한다. 인간이 사는 것은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뭔지 모르는 '맹목적인 의지'가 작동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불교는 이 맹목적인 의지를 업보(業報)로 표현했다. 혹시 원죄(原罪)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 이 맹목적인 의지, 업보를 상징하는 동물이 '소'이다. 왜 하필이면 소에다가 비유했을까? 소는 우선 힘이 세다. 인간의 5, 6배나 되는 힘을 쓴다. 맹목적인 의지라는 것은 엄청나게 힘이 세다. '쇠귀에 경 읽기'라는 속담처럼, 업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업보는 소처럼 우매하면서도 힘이 세다. 하지만 이 소는 동물 가운데서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동물이다. 코에다가 코뚜레를 뚫으면 사람의 통제를 따른다.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간다. 농사지을 때는 사람 몫을 서너 배는 한다.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문화권은 쌀농사를 짓는 문화권이다. 쌀농사의 특징은 수전(水田)이다. 논에다가 물을 채운 다음에 쟁기를 갈고 볍씨를 뿌리는 일은 소가 한다. 서양에는 없는 농사법이다. 소는 쌀을 생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노동력이다. 코뚜레를 뚫고 길들이면 소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노동력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맹목적인 의지도 종교적 수양을 하면 이처럼 길을 들일 수 있다고 보았다.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고, 계율을 지키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음식을 조절하고, 동료와 토론을 하는 과정이 소의 코뚜레를 뚫고 길을 들이는 과정에 해당한다. 그러다 보면 그 맹목적인 의지(소)와 이성이 결국 하나가 된다고 보았다. '인우구망(人牛俱忘)'의 경지이다. 이것이 십우도(十牛圖)의 결론이다. 소에다 코뚜레를 뚫어 쌀농사를 짓는 동양과, 우유와 고기의 획득 수단으로 여기는 서양은 소를 보는 문화적 관점이 서로 다르다. 2008.07.09 23:02 조용헌 goat1356@hanmail.net
|
'´˝˚³οο조용헌 살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금강산'고(考) (0) | 2008.07.15 |
|---|---|
| 을목팔자(乙木八字) (0) | 2008.07.12 |
| 벽해철전(碧海鐵田) (0) | 2008.07.08 |
| 숭례문(崇禮門)과 촛불 (0) | 2008.07.05 |
| 강일독경(剛日讀經) 유일독사(柔日讀史) (0) | 2008.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