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백 일곱 번째 이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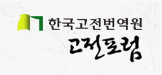 |
만년 성균관 유생의 삐딱한 역사의식
대학 캠퍼스는 자유롭다. 청춘의 뜨거움, 미래의 불안정, 그리고 시대의 열정까지 어우러진 문화적인 해방구가 여기에 있다. 삐딱하게 보든, 엄숙하게 보든, 호언장담하든, 의기소침하든, 무엇을 사고해도 좋고 무엇을 표현해도 좋다. 사고와 표현의 기름 바다에 불만 한번 확 붙여 주면 누구나 광인, 기인, 괴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옛날 대학인 성균관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을까? 소설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의 시대적 배경으로 그려진 정조대의 성균관이 이와 근접했을지 모르겠다. 비밀리에 모여 서학 집회를 여는 유생들, 통속적인 패관소품에 흠뻑 빠져 있는 유생들. 정조가 문체반정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유생들이 이를테면 요즈음 대학 기말고사에서 ^^;; --+ 등 이모티콘을 넣은 문자체로 답안을 작성하듯 통속적인 글쓰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윤기(尹愭)는 경이로운 인물이다. 1773년 생원시에 합격한 이래 1792년 문과에 합격하기까지 20년 가까운 세월을 성균관 유생으로 지냈기 때문이다. 그것도 보통 성균관이 아니라 정조대의 아주 특별한 성균관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으니 말이다. 더욱이, 윤기는 정조대 성균관 유생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노래한 『반중잡영(泮中雜詠)』의 지은이로도 유명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정조대 성균관 유생의 감수성을 느끼는 기분으로 윤기의 글을 읽는 것도 흥미로운 독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 그의 삐딱한 역사의식을 한 토막 옮겨 본다.
역사책을 짓는 법은 요컨대 진실을 기록함에 있을 뿐이다. 진실을 기록했다면 사람의 선악, 사건의 시비, 세상의 치란을 살펴서 알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검은 색과 흰 색이 바뀌고 붉은 색과 보라 색이 섞일 것이니 후세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 당시의 진면목을 징험하겠는가? 공자가 『춘추(春秋)』를 지었는데 글로 보면 역사책이지만 뜻으로 보면 포폄의 취지를 깃들인 것이다. 진실을 기록하는 가운데 천하의 일을 행하였으니 참으로 노(魯)나라 역사책에 진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찌 능히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 불과 진실을 기록함으로써 필삭을 행할 뿐이지 진실을 기록하는 이외에 달리 표준과 준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
후세에 궁궐에서 사필(史筆)을 적신 사람이 설령 성인의 미현(微顯)과 완변(婉辨)의 법을 배우지 못했다 해도 유독 노나라 역사책에서 진실을 기록한 것을 본받을 수는 없을까? 사마천(司馬遷)은 역사가의 재주가 훌륭하다고 이름났지만, 반표(班彪)는 그가 커다란 폐단으로 도를 해쳤다고 논하였고 반고(班固)는 그가 성인을 속였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반표와 반고도 돈을 받았다는 악명을 면하지 못했고 또 사절(死節)을 배척하고 정직(正直)을 부인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비록 ‘사마천과 동호(董弧)의 훌륭함에 비견되고 사마장경(司馬長卿)과 양자운(揚子雲)의 화려함을 겸하였다’는 말도 있지만 문중자(文中子)는 ‘역사책의 잘못은 사마천과 반고에서 비롯하니 이 사람들 이하는 또 필주해서 무엇할까?’라고 하였다.
양웅(揚雄)이 『법언(法言)』을 지었는데 촉(蜀)의 부자가 수천만 냥의 돈을 가져와 책에 기재해 주기를 원하였지만 양웅은 허락하지 않았다. 진수(陳壽)가 『삼국지(三國志)』를 편찬하면서 정의자(丁儀子)에게 ‘쌀 천 곡을 구해 오면 존공(尊公)을 위해 훌륭하게 입전(立傳)하겠소.’라고 하였지만 정공이 허락하지 않아 입전하지 못했다. 손성(孫盛)이 『진양추(晉陽秋)』를 짓는데 시사를 직언하자 환온(桓溫)이 손성에게 ‘방두(枋頭)에서 참으로 승리를 잃었지만 어찌 존군(尊君)처럼 말한단 말이오? 만약 이 역사책이 끝내 유행한다면 그대의 문호와 관계될 것이오.’라고 하였다. 자식들이 울부짖으며 온 식구의 계책을 내기를 청하였는데 손성이 크게 노하자 자식들이 몰래 고쳤다.
위수(魏收)가 『위서(魏書)』를 찬수하는데 올리는 것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하고 누르는 것은 땅에 들어갈 정도로 하였다. 처음에 양휴(陽休)의 도움을 얻었는데 ‘그대의 덕에 사례할 수 없으니 경을 위해 아름다운 전을 짓겠소.’라고 하였다. 이주영(爾朱榮)의 자식이 돈을 바치자 악행을 지우고 선행을 늘려 ‘왜곡된 역사책[穢史]’이 되었다. 오긍(吳兢)이 측천무후(則天武后)의 실록을 찬수하는데 ‘송경(宋璟)이 장열(張說)을 격동시켰다.’고 적어서 위원충(魏元忠) 사건을 증거하게 하였다. 장열이 몰래 몇 글자 고치기를 바랬지만 오긍이 허락하지 않고, ‘만약 공의 요청을 따른다면 이 역사책은 직필이 되지 않소.’라고 하였다.
한유(韓愈)가 『순종실록(順宗實錄)』을 짓는데 논의하는 사람이 시끄럽게 다투고 자꾸 고치기만 해서 완본이 없었다. 이고(李翺)가 ‘지금의 선악은 행장(行狀)과 시장(諡狀)을 취해서 빈 말과 꾸민 말이 많습니다. 직접 사공(事功)을 기재하기를 청합니다.’라고 아뢰었다. 가위(賈緯)는 사관의 수찬이 되어 포폄을 하는데 애증을 마음대로 넣고 논의를 높고 강하게 해서 동료들로부터 가쇠부리[賈鐵觜]라고 지목 받았다. 원추(袁樞)가 열전을 찬수하는데 장돈(章惇)이 동향 사람으로서 그 일을 풀어 줄 것을 구하였다. 원추가 ‘차라리 고향 사람을 저버릴지언정 천하 후세의 공의를 저버릴 수는 없다.’고 하였다. 소성(紹聖) 연간의 사관은 오로지 왕안석(王安石)의 『일록(日錄)』에 의거해 시비의 변란이 일어났다. 진회(秦檜)는 야사(野史)를 금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이른바 역사라는 것은 모두 돈을 받고 쌀을 구하고 위세를 보이고 안정(顔情)을 씀으로써 부림을 받아 왔다. 비록 중간에 허락하지 않은 사람도 몇 사람 있었지만 몰래 고치고 자꾸 고쳤던 일도 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니, 선악과 시비가 혼란스러운데 무엇을 통해 그 진실을 얻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러므로 ‘역사책을 읽는 사람은 참으로 고사(故事)를 갖추어 박람(博覽)의 밑천으로 삼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이 모두 진실하다고 말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잠깐 내가 몸소 친히 본 것으로 말해 보겠다. 내가 일찍이 정조의 실록을 등수(謄修)하는 작업에서 기주(記注)의 본초(本草) 및 재상들의 찬정(竄定)을 보았는데, 권세 있는 사람은 오로지 포장을 일삼아 찬양하는 말이 아님이 없고 비록 한만하고 긴요하지 않은 말이라도 모두 자세히 적었다. 한미한 사람은 전혀 삭제하기도 하고 대충 적기도 하였다. 그러니, 그것이 변화와 가감을 받아 참된 자취를 잃어버렸을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내가 과거에 합격하고 입시했을 적에 임금께서 들려 주신 잊지 못할 은혜로운 말씀이 거의 세상에 드문 것이었는데 하나같이 생략되었다. 다른 사람은 이와 같은 일이 없었는데 도리어 성대하게 일컬었다. 하나를 들면 나머지 셋을 돌이켜 알 수 있는 법이다.
또, 정조대에 『태학은배시집(太學銀杯詩集)』을 간행하라 명하였는데, 임금으로 등극한 후 응제시(應製詩)에서 우등(優等) 및 사제(賜第)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모두 연도별로 기록하여 각각에게 하사하도록 한 것이다. 어명을 받은 신하가 내각에 소장된 『어제윤발(御製綸綍)』, 『일성록(日省錄)』, 『임헌공령(臨軒功令)』, 『임헌제총(臨軒題叢)』, 『육영성휘(育英姓彙)』, 『어고은사절목(御考恩賜節目)』, 『태학응제(太學應製)』, 『어고안(御考案)』 등의 책들을 꺼내서 참조하여 편집하기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인가하였다. 후에 그 책을 차례로 살펴 보았는데 도리어 그 내용이 크게 달랐다. 자기에게 아첨하고 사정(私情)을 주면 크게 적고 거듭 적어 번다해도 줄이지 않았으며 장원이 아니라도 모두 초출해서 특별히 표장하였다. 이른바 인구에 회자된 시구는 대수롭지 않게 보고 쉬지 않고 칼질을 했으며 모르는 시가 나오면 줄이거나 뽑아 버렸다. 과거 시험에 참여해서 처음 벼슬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누구는 취하고 누구는 빼는 차이가 있었다.
시험 삼아 신해년(1791) 한 해를 말하자면 나는 응제(應製)하여 누차 장원이 되고 늘상 포상을 입으며 이어서 급제자로 발탁되었지만 하나도 실리지 않았고 하사받지도 못했다. 저 수 십 년 간 매년 크고 작은 방목(榜目)에서 절로 이미 그런 명백한 흔적이 있으니 오래되어 증빙할 것이 없는 일로 귀결될 수는 없으며 또 잃어 버렸거나 잊어 버렸다고 변명할 수는 없다. 그러니, 비록 더하든 덜하든 남기든 없애든 그 사이에 자기 생각을 허용해서는 안 될 듯한데 이와 같이 어그러지고만 있으니,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여기에서 따로 필삭(筆削)과 여탈(與奪)의 권한을 사용하고 싶어하는데 보통 마음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이런 일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역사책을 짓는 붓 아래에서 생기는 생각이랴!
-윤기(尹愭 1741~1826) 「정상한화(井上閒話)」, 『무명자집(無名子集)』
▶ 성균관 전경
역사는 옛날 이야기이다. ‘옛날’의 범위가 확장되고 ‘이야기’의 방식이 변화하였다는 차이가 있을 뿐 옛날의 역사나 오늘날의 역사나 한결같이 ‘옛날 이야기’라는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 ‘옛날 이야기’ 중에서 역사가가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주로 ‘옛날’이다. 역사학의 전공 분야가 ‘옛날’에 의해서 편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전공, 조선시대 전공이라는 말이 상식 아닌 상식이 되어 역사학을 지배하는 관념이 되어 있다. 하지만, 역사학이 ‘옛날’의 종류에 따라 전공이 분화되어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일까?
반면,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역사가는 드물다. ‘이야기’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옛날’이라도 서로 다른 수많은 ‘이야기’가 난립하고 경쟁하고 있음을 자각할 정도로 풍부한 ‘이야기’의 전통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옛날’이 하나의 ‘이야기’로 전달된다면 그 ‘이야기’는 신화가 되고 그 ‘이야기’에 대한 의심은 신성 모독이 된다. 하나의 ‘옛날’에는 반드시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고 믿는 구도, ‘옛날’의 총체성이 단 하나의 진실한 ‘이야기’에 의해 독점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고 믿는 구도, 그런 구도에서는 역사는 언제나 ‘옛날’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옛날’은 신성해지고 그것에 비례하여 ‘이야기’는 빈곤해지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학이 ‘이야기’의 종류에 따라 전공이 분화될 수도 있다는 상상은 처음부터 한가한 몽상이다.
물론 ‘이야기’ 그 자체가 역사인 것은 아니다. 역사학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이야기’ 안에 있으면서도 ‘이야기’를 초월하는 인간의 삶이다. 하지만, ‘이야기’를 통하지 않고 과연 삶과 대면할 수 있는 것일까? 삶과 ‘이야기’는 서로 섞일 수 없지만 또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법. 마치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과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의 철학적 명제에 빗댄다면 삶은 이치[理]이고 ‘이야기’는 기운[氣]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기운을 떠난 이치가 존재할 수 없듯 ‘이야기’를 떠난 삶이 존재할 수 있을까? 삶의 진실성은 ‘이야기’의 순수성에 의해 비로소 발현되는 것이 아닐까?
‘이야기’의 관점에서 볼 때 조선시대에 역사란 도덕주의의 관점에서 한 사람의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옛날 이야기’였다. 이것은 ‘옛날’을 전달하는 ‘이야기’의 한 가지 양식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 시대에 가장 표준적이고 가장 정통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양식과 ‘이야기’ 문화에서 재현되는 ‘옛날’이 역사였기에 역사가가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그와 같은 양식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는 것이었다. 춘추사관에 입각해 산출된 강목체 역사는 무엇보다 성리학적 ‘이야기’의 양식과 문화를 가장 훌륭하게 드러낸 것이었으리라.
윤기의 비판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어떤 책이 역사인지 아닌지를 변별하는 기준을 성리학의 전형적인 ‘이야기’ 양식과 ‘이야기’ 문화에서 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진실을 기록함으로써 선악의 평가가 달성되는 것이지 진실을 기록하는 이외에 다른 표준과 준칙, 곧 양식과 문화가 필요한 것일까? 공자의 위대한 책 『춘추』는 어쩌면 공자가 전달하는 ‘이야기’ 양식과 ‘이야기’ 문화의 순정함에서 나왔다기보다 그것이 토대로 하는 역사적 문헌들의 진실성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지만, 역사를 구성하는 문헌들은 과연 얼마나 진실을 드러내고 있을까? 윤기는 『정조실록』과 『태학은배시집』에서 문헌이 산출되는 과정에 개입하는 권력의 문제를 관찰하였다. 권력에 의해 문헌의 진실성이 약화된다면 아무리 공자가 붓을 쥐어도 『춘추』가 나올 수는 없으리라.
윤기는 역사의 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의 표준성을 의심하였다. 그것은 역사가 단 하나의 신성한 ‘옛날 이야기’라는 통념을 부인한다는 측면에서 역사 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삶이 다르듯 진실은 다를 수밖에 없고, 권력에 의해 표준으로 흡수된 진실과 그렇지 못한 진실 사이에도 양자택일의 구도를 넘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삶의 세계에서 진실과 표준은 유동적이다. 표준성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전략보다 더 급진적인 것은 표준성의 다원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결정론의 시각에서 ‘옛날’을 시비하는 전략보다 더 효율적인 것은 과정론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경합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가기에는 윤기(尹愭)의 학풍도 윤기의 스승 이익(李瀷)의 학풍도 아직은 유학사상의 전통 안에 놓여 있는 것이었다.

|
글쓴이 : 노관범
|
'—…³οο ı ĿØЦЁ УØЧ > ´˝˚³οο ı Łονё 時調'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야설(野雪) (0) | 2013.02.19 |
|---|---|
| 현관이 너무 넓어/ 이일향(1930~ ) (0) | 2013.02.16 |
| "스스로 하는 공부…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0) | 2009.04.14 |
| 회식, 표정, 유학 (0) | 2008.10.06 |
| 흥선대원군 (0) | 2008.07.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