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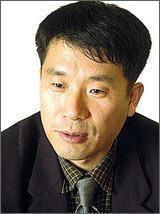
'어중'과 '떼중'
우리말 가운데 '어중이 떠중이'라는 말이 있다. 추측건대 이 말은 불교에서 유래하지 않았나 싶다. '어중'은 '어(御)중'에서 왔다고 본다. 어(御)는 궁궐이나 임금과 관련되는 글자이다. 어명(御命)은 임금의 명령이고, 어가(御駕)는 임금이 타는 수레를 가리키고, 어전(御前)은 임금이 있는 자리를 의미한다. '어(御)중'도 임금과 가까이 있거나, 궁궐에 머무르거나 또는 자주 출입하는 중을 일컫는다.
신라에서 고려에 이르기까지 왕자 또는 상층귀족의 자제들이 중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이 되는 것은 세상근심을 벗어나는 해탈의 길이고, 부처가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만인이 선망하는 영광스러운 길로 여겨졌다. 중국 사천성에 머물면서 티베트까지 선풍(禪風)을 전파한 무상(無相)도 신라의 왕자 출신이었고,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義天,1055-1101)도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다. 고려 때는 승과(僧科)제도가 있었다. 제대로 중이 되려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과거시험에 합격해야만 하였다.
승과에 합격하면 집안의 영광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축하파티를 열기도 하였다. 승과출신 승려들은 고려사회의 엘리트로 대접받았고 도력과 학문이 높아지면 국사(國師)나 왕사(王師)가 되어 국왕의 스승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중들이 바로 '어중'이다. '떠중'은 누구인가? '떠중'은 '떼중'을 가리킨다. 떼중을 발음하다 보니까 떠중이 되었다. 떼중은 떼거리를 이룬 중의 무리를 말한다. '떼중'을 수원승도(隨院僧徒)라고 한다. 이들은 신분이 낮은 계층이었다.
사찰을 짓거나 보수하는 공사 현장이나 제방을 쌓거나 성을 쌓는 일, 나라에 전쟁이 나면 군사로 동원되는 중들이었다. 거란이 고려에 패한 배경에는 떼중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전해진다. 머리는 깎았지만 평상시에는 절에 머무르지 않고, 처자식을 부양하며 민가에서 생활하였다. 떼중은 보통 수백에서 수천명의 무리를 지었다. 기록에 보면 통도사의 경우에는 3000명의 떼중(隨院僧徒)을 데리고 있었다고 나온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고려시대 같았으면 '어중'에 해당한다. 총무원장이 탄 승용차의 트렁크까지 열면서 심하게 검문검색을 하는 것은 불교의 전통예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2008.08.11 23:29 조용헌 goat1356@hanmail.net
| |
|


